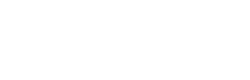- [권오덕 음악 칼럼] 베토벤에 얽힌 추억
탄생 250주년, 우주선에서도 그의 음악 흘러
2020년은 악성(樂聖) 베토벤이 탄생한지 2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나 1827년 빈에서 죽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음악가가 나왔지만 악성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은 오직 베토벤뿐이다.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등도 베토벤을 넘어 서지는 못했다. 필자 역시 그를 최고의 음악가로 생각한다. 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곡가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 베토벤의 사색 |
그의 작품이 나온 지 200여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수억의 인류가 그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 수많은 음악회에서 그의 작품이 연주되고, 휴대폰 벨소리 등 생활 속에서도 그의 음악은 쉼 없이 흐르고 있다.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서도 그의 음악이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다. 40여 년 전 발사된 무인우주선 보이저 호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현악4중주가 바흐 모차르트음악과 함께 흐르고 있는 것.
30년 전 빈 국립묘지 참배, 살던 집 방문 못 잊어
필자에겐 베토벤에 얽힌 추억이 많다. 그의 음악을 제일 먼저 접한 것은 60여 년 전 고교 시절 학교 음악시간이었다. ‘따. 따. 따. 따-’로 시작되는 운명 교향곡이다. 5월 중순 따뜻한 초여름의 오후 음악시간은 졸리기 십상이었다. 더욱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약간의 운동을 하고 들어온 직후라 땀도 나고 졸릴 법도 했지만 워낙 심각한 음악인지라 연신 흐르는 땀을 손으로 씻으며 집중해 들었다.
K음악 선생님은 내 곁에 웃으며 다가와 땀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마치 “얼마나 음악 감상에 몰두하면 저리 땀을 흘릴까”라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이를 계기로 나는 베토벤 작품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9개의 교향곡과 ‘비창’ ‘월광’ ‘열정’ ‘발트슈타인’ ‘템페스트’ ‘고별’ 등 표제가 붙은 피아노 소나타와 ‘크로이첼’과 ‘스프링’을 비롯한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닥치는 대로 들었다.
40-50대에는 ‘그대를 사랑해’ ‘아델라이데’ 등 성악곡과 3개의 첼로 소나타 및 ‘대공’ 등 피아노트리오, 오페라 피델리오, 뛰어난 종교곡 등 수 많은 장르에 걸쳐 그의 작품을 감상했다. 나이 들어선 실내악의 최고봉인 16개의 현악4중주를 즐겨 듣고 있다. 19c의 유명한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가야할 것으로 성서와 베토벤의 현악4중주 전곡 음반을 들었다.
흔히 유명 음악가의 키워드를 말하는데 슈베르트는 ‘절망 속의 희망’이다. 미완성 교향곡과 겨울 나그네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슈만은 ‘사랑’이다. ‘시인의 사랑’가곡집을 비롯해 수많은 가곡과 교향곡을 들어보라. 쇼팽은 ‘그리움’이고, 평생 독신으로 은사 부인 클라라를 사모하며 플라토닉러브를 해온 브람스는 ‘결핍’이 키워드. 비창으로 대변되는 차이코프스키는 ‘꿈’, 쇼스타코비치는 ‘고발’이다.
그렇다면 베토벤의 키워드는 무언가? 바로 ‘자유에의 쟁취’다. 그를 들으면 열정, 투쟁, 자유로움이 철철 흐른다. 그는 음악가에 치명적인 청력상실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다. 자신의 내면적인 고통과 소망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투쟁정신을 그의 작품에서 듣는다. 이같이 수많은 작곡가들은 각각의 키워드를 일생동안 예술로 승화시켰다.
나는 지난 1989년, 1997년, 2011년 3차례 음악의 도시 비인을 방문했다. 스테판 대성당과 쉔부른 궁전, 호프부르크 궁전, 훈데르트바서와 케른트너 거리 등 수많은 명소를 돌아봤지만 나에겐 중앙국립묘지가 가장 인상 깊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인 베토벤묘지를 참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명화 ‘제3의 사나이’의 라스트신에 나오는 길목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베토벤묘지를 그냥 방문할 수 없어 인근에서 들꽃을 꺾어 묘소 앞에 놓고 묵념을 했다. 부근에는 슈베르트 등 수많은 작곡가들이 묻혀 있었다. 1802년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자 자살을 생각하고 동생들에 유서를 썼던 ‘하일리겐슈타트’도 들렀다. 그러나 그가 거주했던 지역에 숲 대신 건물이 빽빽이 들어섰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는 그곳에 못가 아쉬웠다.
하일리겐슈타트엔 베토벤관련 각종 기념물이 조성돼 있다. 대문엔 ‘베토벤이 살던 집’이란 팻말이 붙어 있는 집이 많았다. 또 곳곳엔 문에 솔가지를 달아놓은 ‘호이리게’가 있었다. 그해 나온 첫 포도주를 파는 곳이다. 옛날 이 지역은 베토벤이 귀 먹기 전에 산책하며 악상을 가다듬던 숲속이다. 시냇물 소리, 메추라기, 뻐꾸기, 나이팅게일, 방울새 소리 등을 6번 전원 교향곡 2악장에 표현했었다.
베토벤은 22세부터 57세 죽을 때까지 35년 간 비인에 살면서 79번이나 이사했다. 집관리가 엉망이었다. 가난한데다 한 밤중에 피아노를 마구 쳐 집주인과 마찰을 자주 빚었다. 악상이 떠오르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노트에 악상을 정리했다. 한 번은 이사 중 베토벤이 안 보여 마부가 찾아보니 숲에서 밤새도록 악보에 곡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활기차고, 도전적이고, 투쟁적인 곡 많아 좋아해
그는 고전주의시대 마지막 작곡가이자 낭만주의시대를 연 작곡가다. 오랫동안 상류사회의 들러리였던 음악 그 자체에 확고한 존재감을 부여한 작곡가이다. 베토벤은 음악이 왕과 귀족들의 소일거리, 또는 교회에서 종교적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쓰이던 도구에서 탈피해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했다. 나는 활기차고 도전적이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곡이 많아 베토벤을 좋아한다.
2020년은 그의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그를 기리는 수많은 연주회나 세미나가 세계 곳곳에서 열릴 것이다. 베토벤마니아로선 반길 일이다. 또 라디오나 티브이 등 영상매체들도 다투어 그의 작품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조명할 것이다. 기대가 크다. 특히 그가 태어난 독일의 본을 비롯해 그를 키운 비인은 엄청난 축제를 벌일 게다. 그쪽은 못가도 국내에서 벌이는 잔치라도 가봐야겠다.
 |
권오덕(수필가·전 대전일보 주필)
목요언론인클럽 webmaster@mokyoclub.com